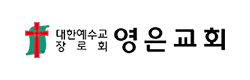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세상터치
나의 친애하는 적에게
20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날, 뒤 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해 이 글을 쓰고 있다.
국감 기간에 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보도를 추려보니, 공허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매년 펼쳐지는 ‘국감’ 이란 정치 이벤트는 늘 요란하게 문을 열었다가 민망한 얼굴로 슬그머니 문을 닫아버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물론 올해 국감엔 ‘유치원 비리’ 나 ‘공기업 채용비리 ’ 와 같은 굵직한 이슈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따져보건대, 그리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저급한 정쟁만 되풀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NGO 국정감사 감시단이 이번 국감에 매긴 점수는 겨우 ‘C’ 학점에 불과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꾹감 이란 칼자루는 국민이 쥐어준 것이고,
이를 잘 휘두르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하지만 그들이 행정부를 향해 정확하게 휘둘러야 할 칼날이
상대 당을 겨눌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국감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이미 익숙해질 만큼 악숙해진 풍경이다.
우리 국회는 어떤 연유로 ‘민의(民意)의 전당' 아닌 ‘적의(敵意)의 전당’ 이 되었다.
아마도 상당수 정치인 들이 ‘원한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치는 상대를 ‘악' 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 이라고 믿 는사람들의 전유물이었고, 그 유구함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말하자면 적과의 공생이 아니라, 적을 박멸하는 것이 정치 생명의 연장술처럼 여겨지는 것이 한국 정치판의 ‘민낯’ 이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 경쟁을 펼치는 곳이다.
그러므로 상대 당과의 적대적 관계 는 불가피하다. 어차피 적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업이라면,
적과 더불어 살아가는 품격에 대해 고민해볼 순 없을까.
막말과 고성으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비판으로 더 나은 가치를 찾아낼 순 없는걸까.
조롱과 비판은 엄격히 다른 것이다. 조롱은 상대는 단순한 ‘악인(惡人)’ 이고,
나는 심오한 ‘선인(善人)’ 이 란 생각에 기초한 ‘언어폭력’ 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가장 손쉽게 끌어내리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격도 단숨에 추락하고 만다.
반대로 정확한 비판은 상 대를 가치 경쟁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정확한 비판으로 상대를 찌를 때, 그와 나는 좀 더 나은세계로 함께' 발을 옮길 수 있다.
정치판에서 적을 대하는 태도는그래서 중요하다.
단순하고 저열하게 적을 조롱할 것인가, 아니면 복잡하고 심오하게 적을 비판할 것인가.
결국 후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자신의 적을 친애하는 사람들의 심오한 무대여야 한다.
그런 것이 정치라면, 우리가 대체 정치란 것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은 있는 걸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국감자료를 정리하면서, 나는 던져본다.
〈글 |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6 동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