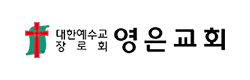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세상터치
아버지가 삼킨 눈물
몇 해 전 그날, 아버지는 몹시 쪼그라들어 있었다.
알 수 없는 병명으로, 서울의 큰 병원에 검진 차 올라 온 날이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은 눈치껏 조퇴를 하느라,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싸 준 도시락을 병원 한 구석에서 먹고 있었다.
밥알이 여기저기 흘러 있고 반찬도 형편없어 보여서, 나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 즈음에 아버지는 알 수 없는 근육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중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보행도 불편한 지경이었지만, 하필이면 엄마까지 발목을 다쳐 서울 병원에 아버지 홀로 올라온 참이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은 채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일흔 살 아버지의 손이 퍽 앙상해서, 서른일곱 아들은 마음이 몹시 어수선했다.
드디어 아버지가 호명되고, 의사 앞에 앉았다.
병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의사는 이것저것 물어봤는데,답하기가 곤란할 때마다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찾았다. 의사는 아버지를 높은 의자에 앉히고, 다리를 굽혔다 펴보라고 했다.
아버지가 땀을 홀리며 안간힘을 써 봤지만, 다리는 가까스로 움직이다가 풀썩 내려앉곤 했다.
아버지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아버지 손이 조그맣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분명히 보았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명명이 불분명하다” 고 말할 때,
아버지 눈에 설핏 비쳤던 눈물을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 손에 이끌리다가, 다 자란 뒤엔 부모의 손을 이끌어야 하는 촌재다.
부모의 돌봄을 받던 아이는 자라서 부모를 돌보는 어른이 된다.
아버지 눈에 설핏 비쳤던 눈물은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였을까.
그러나 그날 아버지는 끝내 울음을 삼켰다. 눈두덩이 벌갛게 번진 채로,
아들 앞에 눈물을 쏟는 일만은 최선을 다해 참아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내 아이가 나 때문에 고통 받을까봐 그랬던 것이리라.
아버지는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
힘들게 울음을 삼칸다는 건, 실은 목 놓아 크게 울고 있다는뜻이다.
아버지의 병명은 끝내 불확실한 ‘의중' 이란 형태로 진단명이 내려졌다.
다행히 그 진단이 어긋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럭저럭 노넌을 견뎌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는 중이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보긴 힘들다.
아버지로서의 삶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내려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건강이 따라주질 않는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숱하게 삼키기만 했던 눈물에 조금씩 잠겨왔던 건 아닐까.
아버지가 병치레를 하는 그 몇 해 동안 나도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되니 아버지가 삼켰던 눈물이 비로소 제대로 보였다.
나 역시 가끔 아버지로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남몰래 눈물을 삼키곤 한다.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가 되어 나는, 자꾸, 목이 멘다.
〈글 |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5 동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