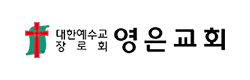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세상터치
우리는 시를 들었다
두남자는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44분간 이어졌지만,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순 없었다.
간간이 새소리가 들려서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상상이 아닌 현실임을 일깨웠으나,
무성영화처럼 이어지는 두 남자의 대회는 아무래도 초현실적인 장면처럼 보였다.
바람이 살금살금 드나들고 햇살이 포르르 내려앉는, 그런 조심스런 봄 날이었다.
분단된 한반도의 두 리더가 침묵 같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대화 장면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켜봤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배제한 채 말하거니와, 그 장면은 그 자체로 몹시 아름다웠다.
나는 흡사 두 남자가 시를 함께 적어 내려 가는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날 우리가 지켜본 것은 한 편의 시였음에 틀림없다.
시는 생략의 언어이자 침묵의 언어다. 밀하지 않고도 말하는 것이 시라는 예술의 본질이다.
우리가 시를 읽 을 때 곤혹스러운 것은 그것이 결코 친절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언어를 들춰내고, 그 의미를 발굴해내는 것이 시 읽기의 괴로움이자 즐거움이다.
그날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선 '한반도평화' 라는 제목의 시 한편이 서술되고 있었다.
정확한 대화의 내용은 오직 두 리더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에 도보다리 대화를 독해하기 위해
독순술(입술 움직임과 표정을 보고 말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방법)’ 전문가가 동원되기도 했지만,
어쩌면 남북 정상의 구체적인 대화록은 영영 알려지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날 우리는 어떤 목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도보다리 대담의 의미를 길어냈다.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러나 시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양하듯, 도보다리 대답을 읽어내는 관점 역시 각양각색이었다.
나는 대체로 '한반도 평화' 라는 낙관적인 견지에서 침묵 같은 대화를 읽어냈지만,
어떤 이들은 낙관이 아닌 비관적인 시선으로 도보다리 대담을 독해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히는 눈초리 말이다. 지난 세월 북한의 조변석개(朝變夕改)의 역사를 떠올리면,
그런 의구심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테다. 이제 겨우 출발선을 떠난 시점에서,
나는 그와 같은 비관적 시선도 함께 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낙관적인 독해자이든 비관적인 독해자이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다시 찾아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엔 이견이 없기를 고대 한다.
어떤 꿍꿍이가 숨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북의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장도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 여행길이 여전히 흐릿한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여행길 위에서 ‘완전한 비핵화 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 역시 동반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도보다리 대담을 낙관적으로 읽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곤 한다.
두 남자는 그날 한민족 앞에 시를 한 편 남겼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시를 정확하게 읽어낼 방도는 없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의편에 서고 싶다. 그 시는 분명 평화를 노래했던 것이리라.
그날 유일하게 도보다리 대화를 엿들었을 새들의 고요한 지저검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다.
두 남자 앞에 는 북미회담이라는 더 험난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두 남자가 함께 적은 시는 고통의 노래이기도한 것이다.
맑은 새소리가 흐르는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시 한 편이 고통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글 |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5 동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