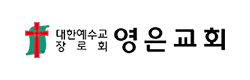세상터치|
‘갈릭 걸스’ 와 ‘컬벤져스’
평창올림픽의 최고 스타를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여자 컬링 대표팀을 선택할 것이다.
컬링이란 스포츠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전원 김씨 성을 가진 팀 킴 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컬링의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컬링은 얼음 위의 바둑 이라고 불린다는데, 컬링 규칙을 제대로 알고 보니,
바둑보다도 더 짜릿한 지능 플레이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운동이었다.
스톤을 위치 시킬 때, 지금보다는 다음 판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했는데,
이 때 상대의 수를 먼저 읽어내는 능력이 승패를 좌우할 때가 많았다. 이를테면 예지력과 근력의 합작이랄까.
이 매력적인 스포츠에 완전히 매료된 나는, 지금 전국의 컬링장을 검색 중이다.
언젠가 나도 한 번 얼음판 위에서 스톤을 던지면서 ‘‘영미~!” 하고 외쳐 보리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컬링 경기에 매료됐던 건 반드시 컬링이란 스포츠의 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컬링만큼이나 매력적인 동계 스포츠는 얼마든지 있다. 김연아가 은퇴했지만 피켜 스케이팅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얼음 레이스를 아찔하게 질주하는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공중 곡예가 매혹적인 스키 점프나 스노우 보드도 내 마음을 울렁이게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니 내가 유난히 컬링에 빠져버린 건 스포츠 자체 보다는 사람 때문이었다.
경북 의성 출신의 저 젊은 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태극 마크까지 달게 됐을까.
의성은 마늘로 유명한 전형적인 농촌이다.' 팀 킴’ 의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은 방과 후엔 컬링을 하고,
주말이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던 시골 아이들이었다.
자매인 김영미와 김경애는 아버지를 어려서 잃었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두 자매의 어머니는 홀로 남의 밭일을 도와주거나 공장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다.
그 어머니가 컬링장 한 견에서 홀로 옹원히는 모습을 우연히 봤다.
새까만 얼굴에 수수한 옷을 걸친 전형적인 시골 아낙이, 남몰래 눈물을 훔쳐 가며 조그맣게 딸들을 옹원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반전이 뭉클했던 것 같다. 요즘은 운동 역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잘 할 수가 없 는 시대가 됐다.
부모의 든든한 지원이 없다면, 스포츠에서도 맨 꼭대기에 오르기 힘든 시대다.
하지만 시골 에서 변변한 지원도 없이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어렵게 운동을 해왔던 젊은 여성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건 것은, 우리 시대의 논리를 뒤집는 반전의 승리였던 것이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마늘로 유명한 의성 출신이란 접 때문에 말릭 걸스(garlic girls, 마늘 소녀들)’ 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팀 킴’ 의 선수들은 자신들이 '컬벤져스(컬링+어벤져스)’ 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동의한다. 그들은 '갈릭'의 고장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자본이라는 시대의 논리에 통쾌한 복수를 가한 ‘어벤져스’ 임에 틀림없다.
이 통쾌한 복수극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길,
나는 소망한다. 가진 것 없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자본의 논리에 맞서 제 영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나는 간절히 꿈꾼다. ‘‘영미야~!” 라는 구호 덕분에 '국민 영미’ 로 우뚝 선
김영미 선수가 ‘이제는 스타가 됐으니 어떤 광고를 찍고 싶으냐 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소외된 계층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광고라면 더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자본 제일의 세상에 대한 선한 복수가 아닐까. 나는 '컬벤져스’ 의 최후의 팬으로 남을 생각이다.
<글|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5 동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