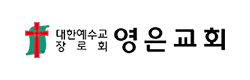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 세상터치
버려진 섬에도 꽃은 피어난다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다시 읽고 있다. 이 소설은 극명한 사실을 묘사하는 첫 문장으로 시작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왜 꽃이라는 체언이 ‘은’ 이 란 조사가 아니라, ‘이’ 라는 조사를 취했을까.
바로 이 '은' 과 ‘이’ 라는 조사를 놓고 작가는 며칠씩이나 장고를 거듭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에?
김훈 작가의 설명은 이렇다. '꽃은 피었다' 로 서술하게 되면, 작가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꽃이 피었다로 서술하는 순간 주관적 정서는 사라지고, 엄연한 객관적 사실만 남게 된다는 게 김훈 작가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패망에 직면했던 순간, 그 섬뜩한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서술하기 위해 조사 하나를 놓고도 집요하게 고민했다는 얘기인데,
치열한 작가 의식에 절로 존경을 표하게 된다.
김훈의 문장 얘기를 다소 장황하게 한 건, 〈칼의 노래〉가 서술하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가 그야말로 '버려진 섬’ 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근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흐릿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선 선재 타격론이 거론되고 있고,
김정은 역시 참모들을 통해 ‘테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며 협박을 거듭하고 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분명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 걸까.
그리하여 나는 한반도에 닥쳤던 또 다른 비극의 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바로 1950년 6월 25일이다.
그 때도 위기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가 됐을 터였다. 그러나 위정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대중들도 그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이 결여 된 상태였다.
1950넌 6월 25일자 동아일보 2면 톱기사를 본다. ‘귀금속상을 위시 불경기에 비명’ 이란 제목의 기사다.
‘귀금속 가게, 양복점, 양화점 등이 장사가 안 돼 울상 이란 내용이다.
온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그 날 아침, 유력 신문은 불경기를 염려하는 기사를 실었다.
약 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그 엄청난 포화 앞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푸념은 다소 한가로워 보인다.
물론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해보자면, 인간은 언제나 불확정적인 존재여서, 자신에게 닥칠 화를 미리 인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겠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지식인 그룹이라는 언론이 그날 아 침 저토록 한가로운 기시를 실을 수 있었을까.
인간은 당장 내일의 삶도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선 성찰하고 대비 할 순 있다.
말하자면, 67년 전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성찰과 대비를 게을리 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후예인 우리여,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우를 범하진 말자.
서울 상공에 북한의 핵 폭탄이 떨어지면, 서울에서만 6 · 25 때보다 많은 78만명이 숨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끔직한 분석 앞에서 우리는 더욱 냉정하자. 그래야만 한반도가 버려진 섬이 되는 비극을 막아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 과 의지로, 끝내 전쟁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치원생만 70만 명이 있다. 버려진 섬에도 꽃은 피어나야 한다.
〈글 1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5 동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