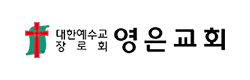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 세상터치
지극히 한국적인 아침
그날 아침, 나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 회사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 시킨 수십 명의 사람들. 그들이 좀비처럼 느릿느릿 버스에 오를 때, 나는 그만 눈을 질끈감고 말았다.
그순 간 며칠 전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 올랐기 때문이다.
그 영화는 '옥자' 다. 그렇다. 봉준호 감독의 그'옥자' 말이다.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슈퍼 돼지이야기가 출근길 샐러리맨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있다.
매우 상관있다. 내가 그날 목격한 아침 풍경이 옥자의 한 장면과 정확히 포개졌기 때문이다.
옥자(슈퍼돼지의 이름)를 빼앗긴 산골 소녀가 우여곡절 끝에 뉴욕에서 옥자를 찾아내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다.
옥자는 육류로 가공되기 직전에 구출됐지만, 다른 수 많은 슈퍼돼지들의 처지는 다르다. 옥자가 밖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스크린 한 쪽에는
철창 안에 갇힌 수백 수천 마리의 슈퍼돼지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보인다. 사방이 갇혀버린 공간에서, 누군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딱한 처지의 유전자조작 동물들
말하자면 영화 속 슈퍼돼지는 디지털 시대의 산물이다. 디지털 기술이 창조해낸 생명체가 바로 슈퍼돼지다.
그 날 아침, 내가목격한한무리의 샐러리맨들은 하나같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저 습관처럼 보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생존하는 한 방법임을 생래적으로 익힌 결과인지도 모른다. 디지털 기술에 종속된 존재라는 측면에서, 영화 속 슈퍼돼지와 현실속 현대인들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나는 종종 두렵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얼굴이. 어느덧 종이신문 대신 모바일 뉴스를, 레코드 대신 음원 스트리밍에 익숙해진 우리는,
어쩌면, 슈퍼돼지처럼 디지털 기술에 포획된 촌재가 돼버린 건 아닐까. 종이책과 신문, 만년필이나 연필같은 아날로그적 사물과 육체적인 접촉을 하던 기억은 자꾸만 아득해진다.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세일즈맨의 아내는 아들에게 이런 절박한 이야기를 꺼낸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 그렇지만 그는 한 인간이야. 그리고 무언가 무서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해. 늙은 개처럼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돼.'’
지극히 한국적인 아침에, 스마트폰에 포획된 샐러리 맨들이, 디지털이라는무덤 속으로 차례차례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글 |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5 동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