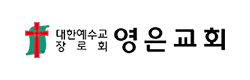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세상터치
가늠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벌써 3년 전 일이다. 내가 신문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취재할 때, 내겐 아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몇 달 뒤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생기고 그 다음해. 세월호 1주기 기획을 준비하면서 참사 당시 내가 썼던 기tk들을 다시 읽어 볼 일이 있었다.
기사를 쓰던 당시 느끼지 못했던,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몰려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방송사로 일터를 옮기게 됐다. 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어지러운 시간을 보낸 뒤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쯤이다. 생방송을 앞둔 시간에 세월호가 인양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급하게 특보를 전해야 히는 상황에서, 나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현장 화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녹슬고 긁힌 참혹한 선체가 올라오는 화면을 받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 눈물이 고였다.
방송에서 눈물을 차마 보일 순 없었으므로, 홀러내리지 않게 꾹꾹 누르느라, 몹시 고통스러웠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서 선체 드러나자 울먹인 엄마 “아들, 너 주려고축구화 사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조선 일보 3월 24일자 2면)를 읽고도 그랬다.
가슴 한 가운데서 퍼져 나온 고통이 또 다 시 눈물방울에 응고돼 맺혔다.
아들이라는 말. 저 말에 응축된 그리움과 슬픔, 사랑을 다 이해할 순 없으리라.
그러나 나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세월호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체감하게 됐다.
얼마 전 KBS가 제작한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나는 참척의 고통을 감히 가늠해보게 됐다.
다큐에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견디고 있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독백하듯 말히는 장면도 있었다.
어떤 아빠는삭힌 슬픔 위에서 덤덤했고, 어떤 엄마는 응고된 슬픔에 짓눌려 아우성쳤다.
슬픔의 결은 그렇게 다르기도 했는데, 슬픔에 붙들려 차마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렇게 유예되고 흩어진 말들. 세상에서 가장 슬 픈 말은 끝내 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닐까.
세월호 선체는 드디어 육상 위에 누워있다. 그 시커먼 고철 덩어리에서 끝내 닿지 못한 사랑과 그리움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8반 고 백승현 군의 5만원도 1103일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고된 노동 끝에 아들에게 건넷을 저 5만원의 가치를 나는 감히 셀 수가 없다.
3년 만에 다 젖은 만 원 짜리 다섯 장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 그 흔적을 매만지는 어미의 마음을, 나는 감히 더듬어볼 수 없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렇게 겨우 봄이 왔고, 봄날은 또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다.
〈글 |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5 동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