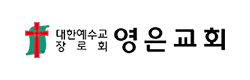이력서의 지겨움
어느 회사의 면접시험 풍경이다. 면접관 너 댓명이 일렬로 앉아 있다. 가슴에 번호표를 단 수험생이 들어 온다.
면접관은 수험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번호로만 그를 호칭한다. ‘'000번 수험생, 자기소개부터 단히 해보세요.'’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 면접관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전공은 뭐 였지요?' ‘‘고향에서쭉 자랐나요?'
무책임하고 건조한 질문이다. 이미 자기소개를 하면서 답했던 것들이지만, 마치 처음 답히는 것처럼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해야 한다.
거듭, 한 면접관이 물어온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게 전부 사실입니까?'
아, 이것은 가슴 한 구석을 철렁하게 하는 질문이다. 이력서란 온갖 허풍이 사실처럼 포장된 것이건만(저는 오직 이 회사만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 할 것이며….), 수험생은 당혹감을 감추며 ‘‘전부 사실입니다’ ,
또다른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쓸쓸한 풍경이지만,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력서를 쓰기 위해선 거짓말을 거짓처럼 말하지 않는 연기력이 필요한 게 지금 청춘들의 현실이다.
그것은 혼자 추는 왈츠처럼 쓸쓸한 일이지만, 달콤하게 상대를 속이지 않고선 밥벌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력서의 표준적인 거짓말이란 이런 것. 나는 잘났고, 둥글둥글하고, 예의 바르다는 사실을 태연하게 적는 것. 최대한 은밀하고 겸손하게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것.
하지만 가능한 포장술을 잔뜩 늘어놓아도 늘 허기지는게 이력서다. 채우고 또 채워도 어쩌면 그렇게 빈칸이 많이 남아 있는 걸까.
무슨 무슨 자격증과 각종 경력을 기록해야 하는 빈칸들 언젠가는 저 빈칸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밥벌이가 다급한 청년들은 똑같은 이력서를 회사 이름만 바꿔가며 제출 하기에도 바쁘다. 그래야만 겨우 밥벌이를 구할 수 있 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소설가 김훈은 어느 산문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 했더랬다. ‘‘아,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그러나 그 지겨운 밥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 땅의 청춘에게 밥벌이는 요원한 일이다. 그들에겐 밥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드물게만 허락된다.
해마다 청년 실업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금 이 나라의 청넌들은 닭장 같은 도서관에 앉아 누군가가 데려가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기약 없는 이력서를 써 본 사람들은 안다. 오로지 밥을 먹기 위해 이력서를 적어 내려가던 순간들의 수치심을. 한껏 포장 된 문장들을 한 줄씩 적을 때마다
새어나오던 한숨 소리를 우리에게도 한 때는 꿈이란 게 있었다. 불공정한 이 사회를 고쳐 잡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다짐했던 청춘의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밥벌이의 엄중함 앞에서 그런 꿈들은 무용하다. 밥벌이를 고민해야 하는 나이에 이르면, 우리는 누구나 얌전한 팬터마임 배우가 된다.
아, 이 땅의 청춘은 가련해라. 이력서 위에서, 청춘은 독자적인 빛을 잃고 밥벌이를 위한 도구로 추락한다.
이력서를 적는 이 땅의 청년들은 누가누가 더 둥글둥글 하고 더 예의 바른지 경쟁하고 있다. 아, 이력서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어야 한다.
〈글 | 정강현 기자
Copyright @2026 동행. All rights reserved.